거실 문 여는 소리에 삼월이가 냅다 달려와 꼬리 친다.

아니 솔직히 한 5분쯤 후에 달려왔다. 눈치가 백 단이되었으니,
"문 여는 소리가 나긴 났는데, 지금 달려가야 하나? 귀찮은데 부를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
그 우둔한 머리로 우리에 앉아 얼마나 고심했을까 상상한다.
그래도 부르기 전에 알아서 점고(點考)하라고 달려왔으니 기특한 일이지.

여름 나며 살이 쪽 빠지고 털갈이하느라 형편없더니...
이젠 반지르르 윤이 나고 홀쭉한 태가 자리 잡아 보기 좋다.

"뭐라도 얻어먹을 게 없을까?"
거실 문턱에 올라서 서재의 나를 보며 꼬리 팔랑개비를 연신 돌리는데,
참 이쁜 것이 꼭 토깽이 같다.
미스코리아 같다.
사탕 하나를 드렸더니, 입에 물고 쪼르르 우리로 내뺀다.
'안 뺐어먹어 이 년아!'
오전에 도착한 택배 배송 안내 깨똑.
'대문 안 의자에 놓아주세요' 답신을 보내 놓고 잊고 있었다.
의자 위에 놓인 박스를 보고도 아이들 것이려니 신경 쓰지 않았는데,
해가 기울어도 도착하지 않는 것이 이상해 살펴보니 어느 결에 놓고 갔다.
담배나 한 보루 보내시지...ㅎ
'국장님, 자알 먹겠습니다'
상장을 탈 때마다,
아빠가 쓰다듬어 주는 칭찬(... 과 더불어 건네주는 용돈 천 원)을 받기 위해 뒤꿈치가 엉덩이에 닿도록 앞다투어 업장으로 달려오던 아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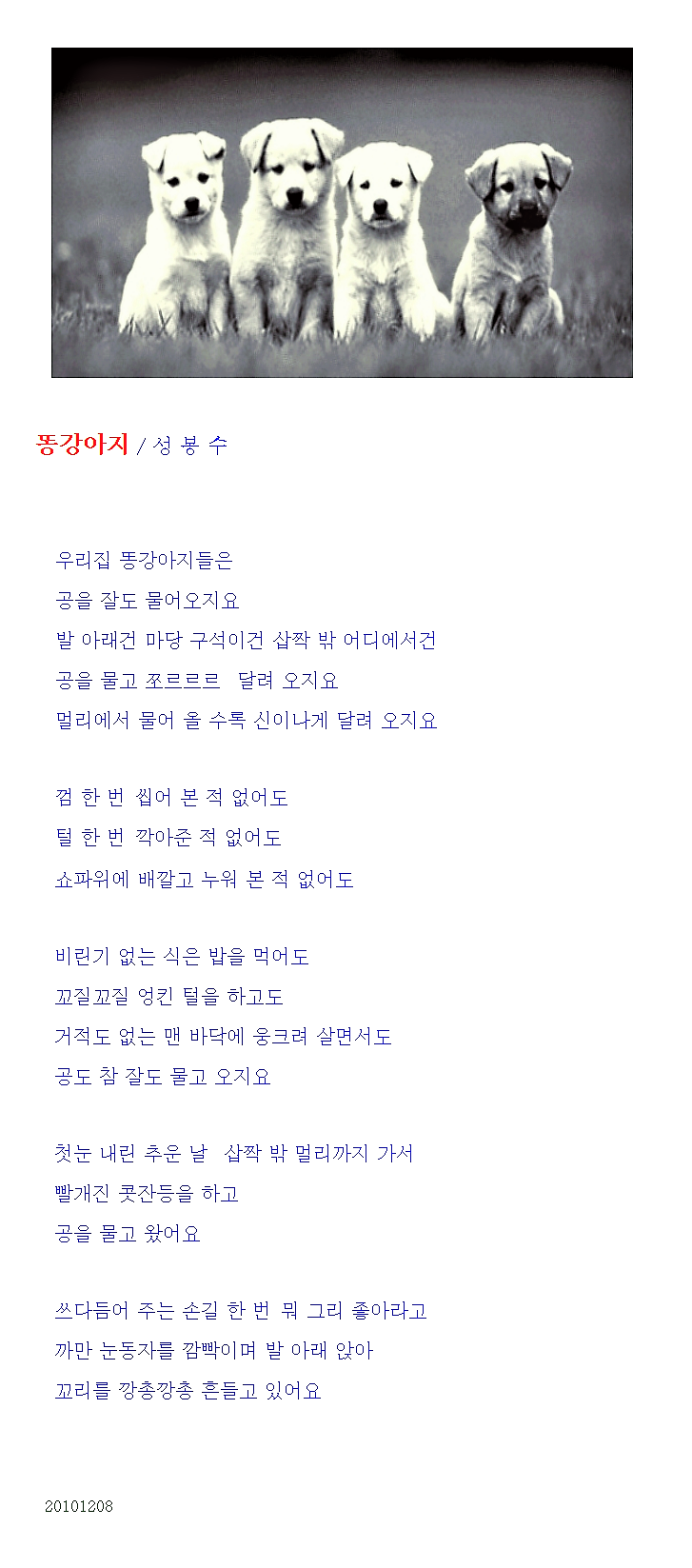
교하 일 번지의 흥부네 아이들 같은 행색을 하고도 늘 밝고 모짐 없던 아이들.
이젠 빈 곳의 크기가 현실에 와 닿는 어른이 되어, 각자의 몫으로 내일을 채워 넣느라 애쓴다.
어제 같은 십 년이 도둑 같이 흘렀다.
번스타인 연주/쇼팽'강아지 왈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