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옥상 반절 중 반을 치웠다.
향 사르고 합장하고.
갈변할 때까지라도 기다려 줄 수 있었더라면 좋았을 일인데. 가을 태풍이 올라오기 전, 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기 전에 마무리하려니 맘이 급하다. 쌓아 놓은 커다란 고무 다라를 들어내니
blog.daum.net
그러는 동안 주문했던 방수 재료들이 하나둘씩 도착했는데, 무게가 나가는 것들이니 현관 앞까지 가져다 놓던 평소와 다르게 대문 밀치지 마자 모두 던져두고 갔다.
이해한다.
토요일.
모임 참석하고 점심 식사 후 돌아와,




白樹 발송 작업
쓰러트려 놓았던 오동나무 베서 정리하고, 나머지 반절 남은 곳을 한쪽으로 치우는데 땀을 비 오듯 쏟으며 똥 쌌다. 필요한 연장과 도구를 챙기느라 열 번도 더 넘게 오르락내리락한 듯싶다. 큰 텃밭의 흙이야 손 가지 않고는 옮길 수 없는 일이니 시간을 쏟아서라도 별수 없는 일이었지만, 장독 옮기는 데는 행여 깨뜨릴라 신경이 곤두선 데다가 된장 고추장 무게가 혼자 들기엔 무리라서 멈칫거렸다. 잡을 곳도 변변치 않고 함부로 힘썼다가는 허리 작살날 것이고... 도와달라고 할까? 몇 번을 고민하다가, 이웃집에 불이 난 건지 잔치가 벌어진 건지 수선을 그리 떨어도 한번 올라와 보지 않는 군상들에게 뭔 말을 하나 싶어 잠재된 초능력을 끄집어내야 했다.
향후 몇 주간 쾌청인 날들이라는 기상예보에 맞춰 서둘러 마무리해야 하니, 계획한 공기를 맞추기 위해 밤늦게까지 후레시를 비추며 물청소까지 하고 미무리.
일요일
'조금 있다가 서재로 들어가야지'
저녁 먹고 티브이 앞에 앉아 속엣말을 중얼거리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자는 것도 아니고 안 자는 것도 아니게 개처럼 쓰러졌다 뻐근한 몸을 뒤척이며 눈을 뜨니 새로 네시 반.
그 시간에 컴을 잡고 앉았다가는 하던 것 마무리할 때까지 일어서지 않을 테고. 그러면 시간이 어찌 될지 뻔한 상황이라서 컴 작업은 포기하고 날 밝기를 기다리며 뭉그적거리다가, 지걱거리는(삼월이 언니 말씀은 손수 네 번이나 씻으셨단다) 아기 고추만 한 삶은 고구마 세 개로 아침 해결하고 그 길로 차 몰고 건재상에서 페인트 롤러 두 개와 레미탈 한 포 더 사다 놓고 작업 시작.
옥상 바닥 마무리하니 마침 점심 밥때다.
삼월이 언니께서 독상 차려주시고는 "나갔다 오니라"하시며, 사탕 얻은 삼월이가 귀를 뒤로 젖히고 우리로 달려가는 것처럼 쌀짝 만한 궁딩이를 매달고 집을 나서신다.
어라?
정확하게 삼십 분 쉬고, 일을 계속하려 마당으로 나서니 하늘이 어둡다.
혹시 몰라 날씨 예보를 확인하니 여전히 쾌청.
안경에 묻은 먼지 때문이려니 생각하고 몰탈을 개서 막 일어서려는데 비가 떨어진다. '뭐여?' 다시 예보를 확인해도 쾌청은 변함없다. 몇 주 전부터 장기 예보까지 살펴보며 잡은 일정이니, '최악에야 지나가는 비 몇 방울이겠지' 생각하고 작업을 시작하는데...
비가 점점 더 많이 온다. 급결제까지 섞어 버무린 몰탈이니 당장 쓰지 않고는 답이 없다. 애라 모르겠다. 일단 시작하고 보자... 비가 점점 많이 계속 온다.
하,
날씨 예보를 몇 번이나 더 확인해도 계속 쾌청인데 비는 계속 온다. 욕이 저절로 나온다. 남의 나라 예보를 본다는 말이 이해된다. 비가 내린 지 몇 시간째인데도 계속 쾌청인 예보. 그때야 알았다. '기상청도 공무원이지. 공무원이니 일요일엔 출근 안 하나 보다. 그렇지 않고야 사람이 쫓아다니며 측우기 속 빗물 계량하는 형편이 아닐 텐데도 계속 '맑음'이라는 예보가 있을 수 있나!'
그치지 않는 비.
헛일한 것을 생각하니 하늘이 야속하다.
"오전 중 일부 지역 빗방울"이란 예보에 '맑음'에도 어제 비가 왔으니 계획했던 오전 작업 일정은 아예 포기했다.
정오에 아점을 먹고-배는 고픈데 꼼지락거리기 싫은 병이 또 도졌다. 먹고 싶지 않은 것을 억지로 한술 떴다- 어제 작업한 것을 살피니 예상보다 흠이 없다.

오후 내내 비가 계속 오기는 했어도 많은 양은 아니었던 데다가, 급결제를 섞어 반죽해서 비 오기 전 오전에 마무리한 덕을 본듯하다.
계단이야 비를 맞으며 작업했으니 당연 쎄멘물이 쓸려 내려가 최상은 아니지만 형태가 무너지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다.-삼월이 년이 먼저랑 똑 같이 고양이 뒤쫓다 한 군데 허물어놓기는 했는데 그것도 왕창은 아니니 되었다.
몰탈을 개서 낙수로 패인 곳과 미진한 곳 더 보강하고, 계단도 처음부터 다시 보강했다.

지금 사진으로 보니, "저까짓 것 하는데 무슨 반나절씩이나 걸려?"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 그래서 곰곰 되짚어 보니, 바닥의 넓은 물골뿐 아니라 콩알만큼 패인 곳, 벽면과 만나는 곳, 벽면, 벽면 위. 작업한 곳이 많았다. 충분히 걸릴 시간이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 보강하면서도 든 생각이지만, '바닥 전체를 싹 덮어서 보강하면 따로 방수 작업할 필요도 없는데...'라는 생각이 간절했다. 남자 한 명만 더 있었으면, 몰탈 여섯 포 만 개면 충분했을 텐데...
내일은 본격적으로 방수 몰탈 발라야 하는데 오전 중 강수확률이 20~30% 예보이니... 기다렸다 오후부터 시작하기엔 시간이 촉박하고 그렇다고 무작정 시작했다가 비 뿌리면 대책 없고...
하,
그나저나 이쪽 마무리하고 저쪽 건 또 어떻게 이쪽으로 다 옮기고 나머지 작업을 해야 하나... 쩝.
저녁이 다 되었다.
서둘러 마무리하고, 씻고 모임 참석.
부실한 아점 한 끼 탓이겠지만, 식사 전 서둘러 마신 소맥 두 잔째에 피잉 돌며 취기가 올랐다. 소맥 한 세트 꺼내 놓고 맥주 반 병은 남기고 나왔다. 서둘러 일어서는 분위기 탔도 있었고.
사람이 있건 없건 여전히 혼술.
시인들 맞어?
예술가 중 '人'字가 붙는 유일한 부류, 시인.
요즘 세상에 시인이 어디 있나. 모두 글 짓는 사람들이지. 이쯤이면 '人'字는 떼어 내고 그냥 뭉뚱거려 '작가'라는 게 옳을 듯도 싶고.
하긴, 실속 없는 시인으로 살아가기엔 세상이 바뀌긴 했다.
202010122601월 김인배 / 운명 이 음악을 듣자니, 한강 다리 위든 천변 어디든 앉아 쐬주 한 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급. 다락방을 열어 본 것이 세 달 전이다. 이방을 열고 시간을 남기는 것을 왜 의식적으로 외면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모르긴 해도, 알 것도 같다. "이 이후엔 내 출판물을 절대 발간하지 마라" 법정 스님이 입적하며 하신 말씀이다. "내 말을 믿지 마라" 석가모니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면서도, 언제부터인지 <안방>에서 주절거리고 있으니 무슨 소용인가? <안방>이 언제부터 이렇게 주절거리는 곳으로 바뀌었을까? 모두 시간이 내려줄 답이다. ※C 선생님께는 미안하다. 공평하지 못해서. 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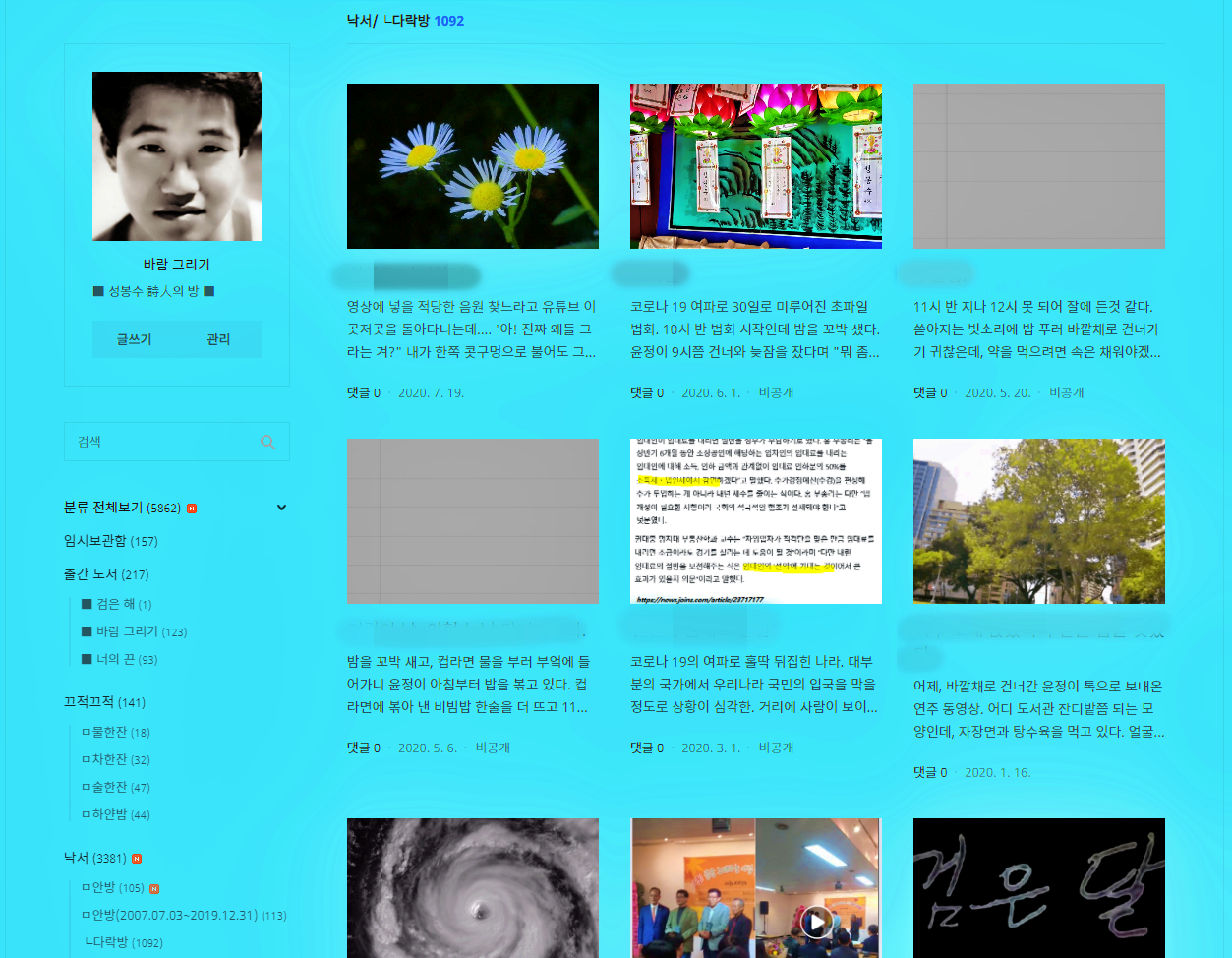
'낙서 > ┗(2007.07.03~2023.12.30)'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0 가을, 오래된 집 마당에서. (0) | 2020.10.31 |
|---|---|
| 걱정 마소서, 일 없습니다. (0) | 2020.10.22 |
| 향 사르고 합장하고. (0) | 2020.10.10 |
| 감사합니다. (0) | 2020.10.08 |
|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온다. (0) | 2020.10.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