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에 만나니 어색합니다"
'허허 그렇네요'
'제 앞가림도 못하는 놈이 무슨 오지랖인가?' 싶다가도,
어느 연 하나 허튼 것 없고 돌고 도는 것이 만사이니 내 아이들이라도 언젠가 그 공덕을 보려니 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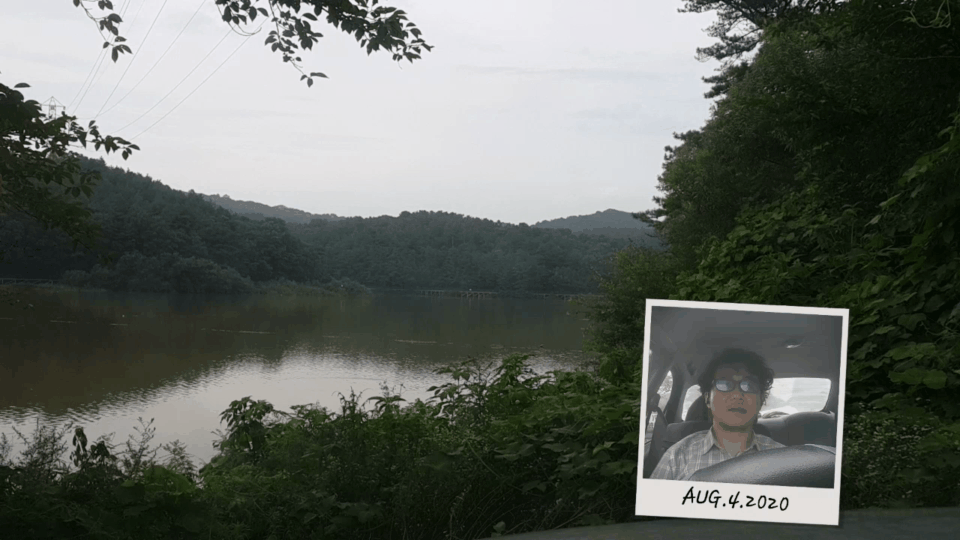
돌아오는 길에 고복 저수지 그 커피숍에 들렸다가 구석진 곳에 차를 멈추고 포장해 온 따뜻한 커피를 마시다.
그 커피숍.
여기저기 시설들이 하나하나 보태지고, 어느 곳에 견주어도 손색없을 만큼 훌륭한 장소로 자리 잡았다. (제일 모자랐던 외부의 화장실, 들려보지 않았지만 걸맞게 바뀌어 있겠지) 평일 낮인데도 그만큼 손님도 많고(전 연령대가 골고루)
그래도, 내가 머문 기억의 그곳은 님이 계신 곳...

집에 돌아와 씻고 한숨 돌리는 찰나에,
바람종의 예고도 없이 쏟아지는 비,
" 와다다다 다..."
그렇게 한동안을.
202008042900화
틀니의 포스트로 쓰기 위해 멀쩡한(다분히 내 의견이긴 해도) 이 세 개를 뽑아낸 자리에 시술한 임플란트 두 개.
한 두 푼의 비용이 아니니 잘 아물도록 조심해야 하는데... 그래서 일단, 담배와 술을 밀어 두었는데, 입이 영 구준하다.
그래서 자유시간 미니 바 한 봉지를 사다 놓았는데, 한번 손이 가면 기본이 두 개 세 개를 털어 넣게 되니 대책 없다.
아무래도 입에 넣으면 오래갈 만한 단단한 것이 나을 듯싶어 오밤중에 편의점에 들렸는데, 편의점에 사탕이 사라졌다는 걸 몰랐다. 오 밤중에 세 군데를 들렸는데도 최고가 '청포도 사탕' 뿐이고, 도무지 깨물어 먹는 다른 사탕은 찾을 길이 없다.
요리조리 살피다가, 수입 사탕 깡통을 사들고 왔다.

<사람은 학습에 의해 만들어지는 개체다>
"애이, 어쩌면 평생 살면서, 애들 먹으라고 풀빵 봉지 하나를 들고 오는 걸 못 봤다니까!"
어머님이 아버님께 눈 흘길 때마다 읊조리시던 단골 메뉴. 그 메뉴의 맛에 일찍 길든 나.
그래서 집에 올 때마다 아이들 앞 앞 껌 하나씩이라도 들고 들어오려 애썼다.
그럴 때 가끔 사들고 왔던 그 수입 깡통 사탕.
종류별로 사서, 막내부터 거꾸로 고르게 했던...
그 사탕을 나를 위해 사들고 왔다고 생각하니 만감이 교차한다.
그 만감 안에 숨어 있던 울화가 잠시 얼굴을 붉히게 하고...

행복이란 게 별거인가? 부모의 몫이란 게 별거던가?
몸은 고되더라도, 별거 아니더라도, 내 새끼들 입에 들어갈 사탕이라도 살 돈을 벌어 그 돈과 바꾼 사탕 하나, 아이스바 하나에 잠자지 않고 기다리며 기쁘게 매달리는 아이들을 보고 더 기뻐하고...
지나고 보니 가장 행복했던 때였네.

희한도 한 일이다
그렇게, 뒤섞인 울화와 애달픔의 잔상이 채 가시지 않았을 때 여자가 말한다.
"만기 돌아오는 셋째 보험을 제 설계해주게 계약자를 변경해 달라"ㄴ다.
'다시 들을 것 같으면 상품 변경해서 말하면 내가 가서 서명해 주면 되지 뭘 번거롭게 같이 가서 계약자를 바꾸노?'
집요하다.
'만기 되면 찾아서 현찰로 줄 테니 걱정마라'했다.
그러면서 작정한 듯,
"어머니 부좃돈도 있고... 집세 들어오는데 왜 펑크가 나며, 펑크 난다는 그 돈은 뭐로 메꾸냐?" 되묻는다.
헐... 이제 삼 년째 들어가는 어머님 부좃도 얘기까지 나온다.
'책 팔린 돈으로 메꾼다'했다.
가소롭다는 듯 '피식' 웃는다.
"수중에 돈 천만 원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또 묻는다.
'말이 된다. 여기 그런 사람이 이렇게 있지 않니? 어차피 니나 나나 남이나 다를 것 없는 형편에... 서로 없는 셈 치고 신경 끄고 그냥 팔자려니 삽시다'라 했다.
'염치없지만, 부좃돈 들어온 거 매형들께 이러저러하고, 만기 지나고 묻어 뒀던 첫째 보험 찾고 어찌어찌 빚 안 지고 유산 정리 마치고...'
이미 다 한 말이다. 그것도 그때그때.
계산서를 작성해서 보고하고 서명을 받았어야 한다는 말인가?
"내 이름 공동으로 넣어줬으면 내가 보태려고 했더니..."
상속 등기 낼 때, 그렇게 비아냥 거리던 사람이 어머니 부좃돈 얘기를 꺼낸다.
'진짜, 생긴 대로 논다.'라며 얼굴에 침을 뱉었다. 물론 맘 속으로다. 공동 명의로 했으면 지금 상황이 어땠을지 끔찍하다. 그리고 참, 여자와 관련된 사람들이 부조한 돈. 그대로 다 줬으면 됐지. 그 돈 있고 없고를 왜 따져? 생각하니 어이없네?.
아... 지금 가만 생각하니, 보험 해약해서 그 돈으로 이빨 할까 봐 그런 듯싶네. 아무튼, 천하에 둘째가라면 서러울 곰이 제 눈 가는 곳은 조조처럼 머리가 휙휙 돌아가는 것을 보면 희한하지.
서울 큰 이모께서, 당신 생질 처가 그런 줄도 모르고
"애, 사람 눈을 똑바로 못 마주치고 눈알을 굴리는 사람은 속이 음해서 못 쓰는 거야"하시더니만...
"이번 생은 조졌다"라고,
내 뒤통수 쓰다듬으며 살고 있는데...
언제 죽든,
죽기 전 까지는 정신 헤까닥 하는 일 없기를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살고 있는데,
큰일이네.
내 안에 그 뜨거운 기억의 불덩이가 또 이글거리기 시작했으니...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