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라가라"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머니가 공주 어디서 나이트클럽(캬바레?)을 했다는 잘생긴 본부중대 선임병. 아직 소대 배치도 받기 전인 갓 전입 신병인 나를 지하 방카 상황실로 불러 세워 무작정 노래시키고는 잠시 침묵하다 뱉은 말. 아마도 신병 자기소개서에 쓰인 <전국 노래자랑> 때문인 듯한데, 침묵의 이유가 지금도 헷갈린다.
"너 이길로 갈 생각 있으면 제대하고 언제라도 찾아와라."
-xxx GP. 대학에서 플륫을 전공하다 ROTC로 임관한 키가 크고 후리 미끈 하던 소대장. 내가 부르는 노래를 듣고 자기 친구가 대학로에서 통기타 카페를 하는데 나 정도면 그 길로 한번 나가봐도 좋겠다면 건넨 말.
그 뿌리가 되었던 기타를 버렸다.
언제인지 모르게 건너채 농 위에 올려져 있던 것을 천정 수리하며 꺼내서 삼월이 언니가 안방에 들여놓았는데 신경 쓰지 않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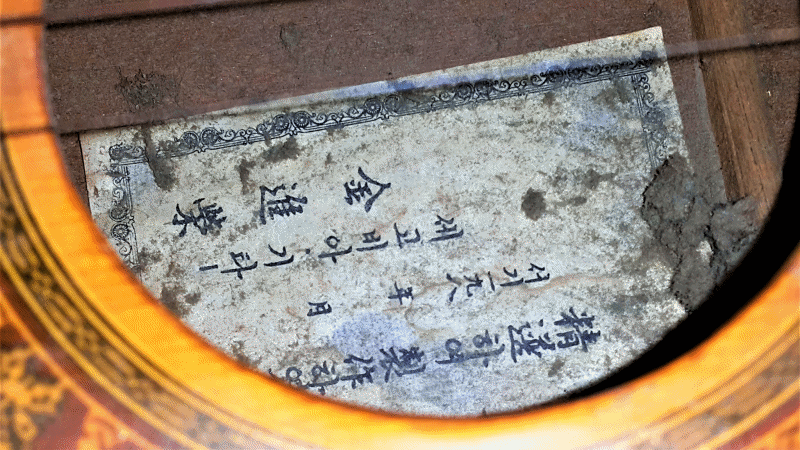
누님들이 치던 클래식 키타로 처음 시작해서, 통기타로, 지금은 순사가 된 청주 친구 GH가 선물해 준 12현 키타로 옮겨 가는 동안 어머님이 박살 낸 것이 두 개였나?
박살난 것 중 성한 클래식 기타의 넥과 통기타의 바디를 이어 붙여 또 발광하다가, 마침 친구 忠厚가 그 꼴을 보고 쓰던 통기타를 줘서 그것을 사용하다 바디의 공명이 시원치 않아(기억의 왜곡이 있을 수 있지만 아마 그 기타도 박살 났을 거다) 넥(지판)을 톱으로 잘라 클래식 기타의 지판과 바꿔 달고 발광하던. 지금 생각하면 어찌 그런 생각을 했는지 참... 지판이 패일 정도였으니 많이 치기는 했다. 어디서 주워 붙인 저 스티커는 또 뭐고? ㅋㅋ
버리기 전에 공명통 안의 상표를 확인하니 '세고비아"다. 내 기억에서 까맣게 지워졌던 단어, '세고비아'. 솜뭉치같이 앉은 먼지처럼 일상에서 잊고 지낸 그때가 언제였나 싶다.
- 바디 한쪽 면이 둥근 플라스틱으로 되어 엠프랑 연결시킬 수 있는 반(일렉)반(통) 기타(한때 기타를 친다 하는 가수라면 모두 들고 나오던). 오래전 친구 양 군이 하산하며 줬는데, 그것은 아직도 내 서재 한쪽에 세워져 있다. 죽기 전 언젠가는 줄을 꿰서 띵가당 거려볼 날이 있으려나 모르겠다.
내 발광 때마다 우리 아버님 18번,
"애이, 시끼러워 죽겠네!"
요즘엔 셋째가 바통을 이어받아 시끄럽다며 컴의 음악을 줄여 놓고 간다.
말년에 뜬금없이 시어미 만났다.
하... 할아버지 성격 닮았으면, 어떤 놈인지 고생 좀 하것다.
"성격이 드러워서 사람을 꼭 후벼 파지!"-아버님 성격에 대한 어머님의 평이셨다.
김인배 선생의 트럼펫은 늘 내 맘을 축축하게 한다.
날이 추워져서 또 병이 도진 걸까?
오로지 술을 사러 오밤에 대문을 밀친 것이 얼마만인가...
-어제의 일이다.

오랜만이긴 했지만, 독주였던 듯 싶다.
숙취는 없는데도 종일 몸이 아팠다.
쌍화탕이라도 사 먹을 생각이었는데 어, 하다 때를 놓쳤다.
그런데 오늘 그 독이 또 먹고 싶었는데, 참았다.
많이 우울했다.
202009293029화
김인배/운명
날 밝았다.
안방 농 위에서 꺼내 놓았던 물건들을 다시 들이려 어머니의 정체불명 보따리를 풀어 정리하는데...
여행 가방 안에 종이를 덧대 잘 개켜 놓은 아버지 한 복 한벌. 하...
그리고 아버지 손가방. 하...
-안에 내용물을 살피니, 병원 입원하시면서 가져가셨던 가방인 듯싶다. 이면지를 잘라 묶어 입원하시기 직전까지 쓰신 금전출납부. 큰 누님이 나 어릴 적 사드렸던 수동식 도루코 면도기(아버지도 좋은 것, 편리한 것 가지고 싶은 똑같은 사람인데... 나는, 왜 좋은 면도기 하나 사드릴 생각을 안 했을까.) 샘플 병에 담겨 색이 바랜 스킨로션...
어머님은 마지막 그 순간의 기억을 놓고 싶지 않으셨나 보다.
내가 지금, "버려야 하는데 버리지 못하는 것". "버리지 않아도 되는데 버리려 하는 것"의 화두를 잡고 맘 아파하는 것처럼 그러하셨나 보다.
아버지 한복을 입고 서서 속 울음 울며 쓰레기 봉지에 하나 둘 담는 동안, " 웬 한복은 입고... 돈뭉치 없나 잘 보라"는 아내의 말.
오늘은,
명절 끝나고 약국 수거함에 가져다 놓을 생각으로 어머니 잡수시던 약을 모두 담았다. 너무 많다. 산 것 같지 않게 사셨던 병 중의 몇 해. 너무 고생하셨다. 우울증 약 한 달치는 따로 빼놓았다. 머리가 아파 혈압을 재보려 했더니 쓰시던 혈압계가 보이지 않는다. 겸사겸사 문갑을 열어봤더니, 방금 다녀가신 듯 정리되어 있다. 이제 생각하니, 주무시는 줄 알고 건너채 내방으로 건너가 컴을 잡고 앉았는 동안, 밤새 그렇게 살림하셨나 보다. 잡수시던 약을 버리면 끝이겠거니 했는데 문갑을 열고야, 구석구석에 버릴 것이 아직도 많다는 걸 알았다. 내 나이로만 따져도, 쉰일곱 해 쌓아온 진정을 아무렇지 않듯 지워버리는 일이 어디 쉬운 일일까만... 불현듯 떠오르는 순간순간이 너무 가혹하다.
정확하게 새로 네시 반.
폐기물 수거 차량에서 유압 모타 소리가 들린다.
"우웅... 드드득..."
아, 어머니 자개장이 부서지고 있구나.
너무 가혹하다.

책꽂이를 더 장만해야 하나 어쩌나 고민된다. 무작정 버리기도 그렇고, 더 끼워 넣을 공간이 없다. 문제는, 끼워 넣기 시작하면 버리기 전 까지는 다시 빼서 본다는 것은 거짓말이 되어버리니...
'낙서 > ┗(2007.07.03~2023.12.30)'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불면의 밤. (0) | 2020.10.03 |
|---|---|
| 세상의 쓸쓸한 이를 위함. (0) | 2020.10.02 |
| 흔적. (0) | 2020.09.27 |
| 도배하는 섬 (0) | 2020.09.26 |
| 세탁기 사망. (0) | 2020.09.23 |




댓글